맥마스터 대학과 MIT 연구팀이 염증성 장질환(IBD) 치료용 신약 ‘enterololin’을 발견했는데, 놀라운 건 AI가 이 약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과학자들보다 먼저 정확히 예측했다는 점입니다. MIT의 생성형 AI 모델 DiffDock이 단 100초 만에 약물의 작용 메커니즘을 예측했고, 연구진은 6개월간의 실험으로 AI의 예측이 맞다는 걸 증명했죠.

핵심 포인트:
- 100초 예측 vs 2년 실험: AI가 약물 작용 메커니즘을 100초에 예측, 기존 2년/200만 달러 소요 작업을 6개월/6만 달러로 단축
- 정밀 타격 항생제: 기존 ‘핵폭탄’식 항생제와 달리 대장균 등 특정 유해균만 제거하고 장내 미생물은 보존
- 3년 내 임상 예정: 스핀오프 회사 Stoked Bio가 라이선스 확보, 인체 적용 최적화 진행 중
항생제의 역설
크론병 같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에게 항생제는 양날의 검이에요. 염증을 줄이려고 쓰지만, 유익균까지 모두 쓸어버리면서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맥마스터 대학의 Jon Stokes 교수는 이런 기존 항생제를 “핵폭탄”이라고 표현했어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광범위 항생제로 장내 미생물이 초토화되면, 약물 내성을 가진 대장균 같은 나쁜 균들이 빈자리를 차지하면서 더 큰 문제를 일으켜요. 크론병 환자들은 이런 악순환에 갇히게 되죠.
enterololin은 다릅니다. Enterobacteriaceae라는 특정 세균군만 정확히 타격하는 ‘스마트 미사일’ 같은 약이에요. 대장균을 제거하면서도 장내 미생물 생태계는 대부분 보존하죠. 생쥐 실험에서 enterololin을 투여받은 그룹은 일반 항생제 vancomycin을 받은 그룹보다 빠르게 회복했고, 건강한 미생물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100초의 마법
약을 발견하는 것과 그 약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밝히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신약 개발에서 가장 큰 병목은 바로 ‘작용 메커니즘(MOA)’ 규명이거든요. 약이 박테리아 안에서 정확히 어떤 단백질에 결합해서 어떻게 세균을 죽이는지 알아내야 하는데, 이게 보통 2년은 걸려요.
Stokes 교수팀이 enterololin을 발견하고 나서 막막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죠. 그런데 MIT 컴퓨터과학·인공지능연구소(CSAIL)의 Regina Barzilay 교수가 개발한 DiffDock이라는 AI 모델이 게임 체인저가 됐어요.
DiffDock은 분자가 단백질에 어떻게 결합하는지 예측하는 생성형 AI인데요, 기존 방식과는 접근이 달라요. 전통적인 도킹 알고리즘이 가능한 모든 배치를 점수화하며 찾아다녔다면, DiffDock은 확산(diffusion) 모델을 사용해 가장 그럴듯한 결합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수렴해 나가요.
연구진이 DiffDock에게 enterololin을 입력하자, 단 100초 만에 답이 나왔습니다. “이 약은 LolCDE라는 단백질 복합체에 결합할 겁니다. 이 복합체는 특정 박테리아의 생존에 필수적인 지질단백질 운반을 담당하죠.”
예측을 증명으로
물론 AI의 예측이라고 해서 그냥 믿을 순 없어요. Stokes 교수는 “AI 모델이 완전히 옳다고 가정할 수는 없지만, 옳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다음 단계의 추측을 없애줬다”고 말했어요.

박사과정 학생 Denise Catacutan이 이끈 연구팀은 DiffDock의 예측을 출발점으로 삼아 검증에 들어갔어요. 먼저 실험실에서 enterololin 내성 돌연변이 대장균을 만들었는데, 놀랍게도 DNA 변화가 정확히 lolCDE 부위에서 나타났어요. RNA 시퀀싱으로 약물에 노출됐을 때 어떤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는지 관찰했고, CRISPR로 특정 타겟 유전자 발현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실험도 진행했죠.
모든 실험 결과가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지질단백질 운반 경로의 교란. DiffDock이 예측한 그대로였어요.
“계산 모델과 실험실 데이터가 같은 메커니즘을 가리킬 때, 그때 비로소 뭔가를 알아냈다고 믿게 되죠.” Stokes 교수의 말입니다.
AI는 도구일 뿐
Barzilay 교수는 이번 프로젝트가 생명과학에서 AI 활용 방식의 전환을 보여준다고 말해요. “지금까지 신약 개발에서 AI는 주로 화학 공간을 탐색하고, 활성이 있을 만한 새로운 분자를 찾는 데 사용됐어요.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는 건 AI가 메커니즘 설명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게 분자를 개발 파이프라인으로 이동시키는 데 결정적이거든요.”
실제로 작용 메커니즘 연구는 신약 개발의 주요 속도 제한 단계예요. 안전성 확인, 용량 최적화, 효능 개선을 위한 구조 변형, 새로운 약물 타겟 발견… 모든 게 여기서 시작되거든요. 규제 당局이 약물 후보가 인체 사용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통상 18개월에서 2년이 걸리는 이 과정을, MIT-맥마스터 팀은 6개월로 줄였어요. 비용도 수백만 달러에서 6만 달러로 대폭 감소했고요.
하지만 Stokes 교수는 AI를 과대평가하지 않아요. “약물 내성 문제와 신약 부족은 새는 수도꼭지 같아요. 한동안 내버려 둘 수는 있지만, 결국엔 큰 문제가 되죠. AI는 제 렌치예요. 범람하기 전에 새는 걸 고치는 도구일 뿐이에요. 제 유일한 목표는 환자들에게 필요한 약을 전달하는 것이고, AI가 그걸 도와줄 수 있는 한 계속 새로운 방법을 찾을 겁니다.”
3년 후 임상시험 목표
Stokes 교수의 스핀오프 회사 Stoked Bio가 enterololin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인체 적용 최적화를 진행 중이에요. 순조롭다면 3년 안에 임상시험이 시작됩니다.
“저를 설레게 하는 건 이 화합물만이 아니에요. AI, 인간의 직관, 실험실 실험의 조합으로 작용 메커니즘 규명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죠. 이건 많은 질병에 대한 약물 발견 접근 방식을 바꿀 잠재력이 있어요.” Stokes 교수의 말입니다.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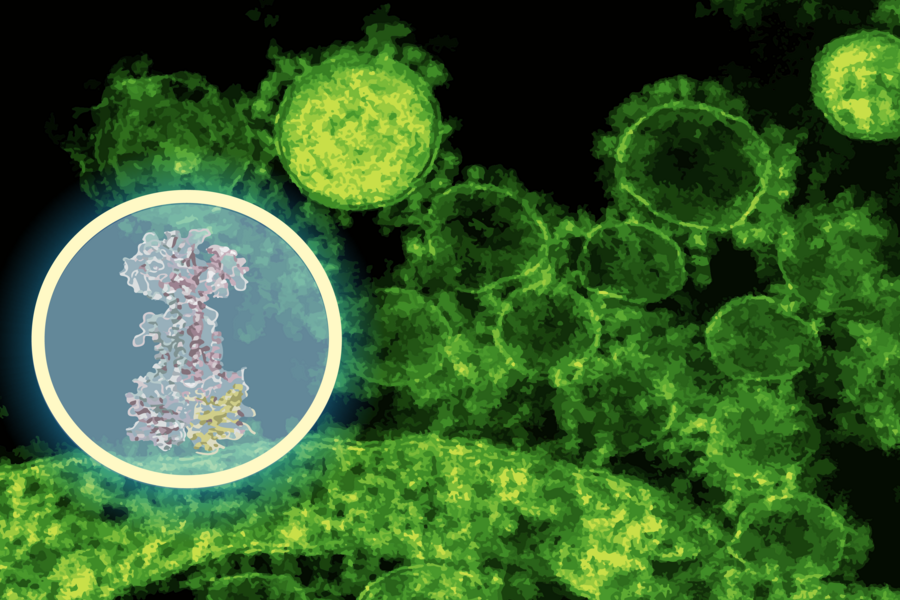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