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의대와 한 저널리스트가 150명을 조사한 결과, 62%가 좋아하는 작품이 완전히 AI로 만들어졌다면 덜 좋아할 것이라고 답했고, 81%는 인간 예술과 AI 예술의 감정적 가치가 다르다고 응답했습니다.
요즘 AI가 정말 대단하잖아요? ChatGPT로 글도 쓰고, 미드저니로 그림도 그리고. 심지어 영화까지 만든다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이 이런 AI 작품을 실제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최근 Scientific American에 나온 연구 결과를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좋아하는 작품이 사실 AI가 만든 거라면?

하버드 의대 교수랑 소설가가 함께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미국인 150명한테 이런 질문을 던진 거죠.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작품을 하나 떠올려보세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AI가 혼자 만든 작품이라면 어떤 기분일까요?”
사람들이 꼽은 작품들도 정말 다양했어요. ‘호밀밭의 파수꾼’,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뮤지컬 ‘해밀턴’, 심지어 ‘길모어 걸즈’까지. 그런데 결과가 정말 놀라웠거든요.
무려 62%가 “덜 좋아할 것 같다”고 답했어요. 32%는 “별 차이 없을 것”, 겨우 5%만 “더 좋아할 것”이라고 했고요.
한 사람은 ‘굿 윌 헌팅’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이 영화는 인간 경험의 걸작이야. AI가 이런 걸 만들 수는 없어.” 뭔가 강한 반응이죠?
감정의 깊이는 역시 다르다고 생각해
더 재미있는 건 다음 질문이었어요. “인간이 만든 예술과 AI가 만든 예술의 감정적 가치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81%가 “그렇다”고 답했거든요. 이건 최근 Nature에 나온 더 큰 연구(참가자 거의 3,000명!)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똑같은 작품이라도 “AI가 만들었다”는 딱지만 붙이면 사람들이 확 낮게 평가하더라고요.
왜 이럴까요?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예술에서 찾는 건 단순히 “예쁘다, 멋지다”가 아니잖아요. 작가가 어떤 마음으로 이걸 만들었을까, 어떤 경험에서 나온 걸까 궁금해하거든요.
책 읽다가 작가 소개 찾아보고, 좋아하는 가수 인터뷰 찾아보는 것도 그런 이유겠죠. 예술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니까요.
철학자 존 듀이가 “예술은 가장 보편적이고 자유로운 소통의 형태”라고 했고, 제임스 볼드윈도 “당신의 고통이 세상에서 처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책을 읽으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다”고 했잖아요.
AI 사용자를 아티스트라고 봐야 할까?

이번엔 이런 질문도 했어요. “AI로 작품 만드는 사람을 아티스트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답변이 재미있게 갈렸더라고요:
- “그렇다”: 13%
- “아니다”: 31%
- “잘 모르겠다”: 13%
- “AI를 제대로 가이드하는 경우에만 그렇다”: 42%
가장 많은 사람이 마지막 답을 선택한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람들이 AI를 완전히 거부하는 건 아니지만, 인간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온라인에서 흔히 보는 “AI 슬롭”(대충 만든 AI 콘텐츠)에 대한 불만도 같은 맥락이에요. 간단한 명령어 몇 개 입력하고 엔터 누르는 게 창작이냐는 거죠.
장르마다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라
연구에서 또 흥미로운 점은 AI가 만드는 예술 종류에 따라 사람들 반응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나마 괜찮다고 본 분야:
- 디지털 아트 (3분의 1 이상이 수용)
- 시나 소설
여전히 거부감 큰 분야:
- 팟캐스트
- TV 프로그램
- 영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일단 초기 AI들이 그림이나 글 생성에 먼저 특화됐으니까 사람들이 익숙해진 것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 보여요. 팟캐스트나 영상 콘텐츠는 “소통”의 성격이 강하거든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팟캐스트를 “보면서” 듣는다고 해요. 진행자 표정이나 제스처를 보고 싶어한다는 거죠. 이런 매체일수록 “진짜 사람”에 대한 갈망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도구로서의 AI는 어떨까?
그럼 AI는 창작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연구 결과를 보면 한 가지 방향이 보여요. AI를 대체재가 아닌 도구로 쓰는 거죠.
생각해보면 예술에는 진입 장벽이 높아요. 영화 만들려면 돈도 엄청 들고, 음악 만들려면 악기도 다뤄야 하고. 물리적 제약, 경제적 제약 때문에 머릿속 아이디어를 현실로 못 만드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블랙 스완’ 만든 대런 아로노프스키 감독이 AI 영화 스튜디오를 차린 것도 그런 이유예요. 돈이나 기술 때문에 못 만들어지는 이야기들을 AI 도움으로 구현해보자는 거죠.
물론 조심할 점도 있어요. 저작권 문제나 딥페이크 같은 악용 사례들 말이에요. 연구진들도 라이선스된 데이터만 쓰는 플랫폼을 선택하라고 조언했어요.
결국은 소통과 연결의 문제
AI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사람들 생각도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 연구가 보여주는 핵심은 확실해 보여요. 사람들은 여전히 예술을 소통과 연결의 수단으로 본다는 거예요.
AI 개발자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도 여기 있어요. 단순히 “더 많은 콘텐츠”를 찍어내는 시스템보다는, 창작자가 자신만의 특별한 비전을 더 잘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미래의 AI 아트는 “AI 대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AI와 함께하는 인간 창작자”의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기술은 계속 발전하겠지만, 사람들이 예술에서 찾는 감정적 연결과 진정성에 대한 갈망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요.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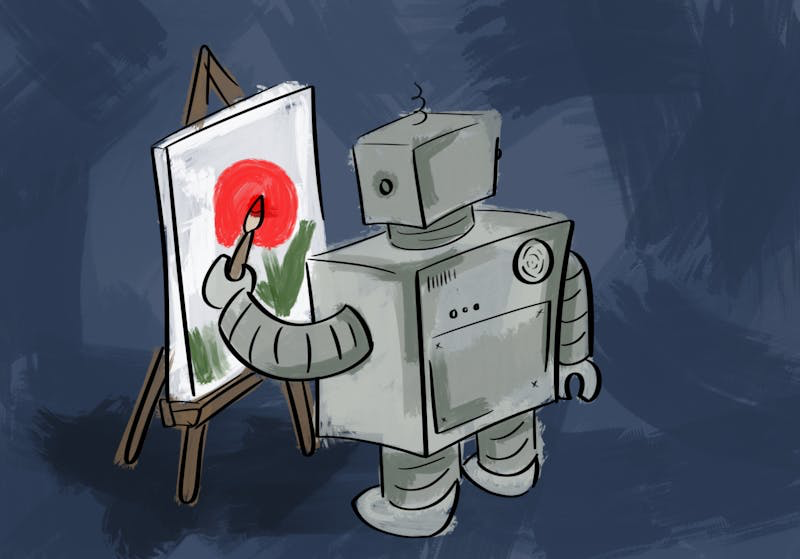
답글 남기기